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매일 책을 읽고, 읽은 만큼 글을 씁니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니시노 게이지 지음, 조해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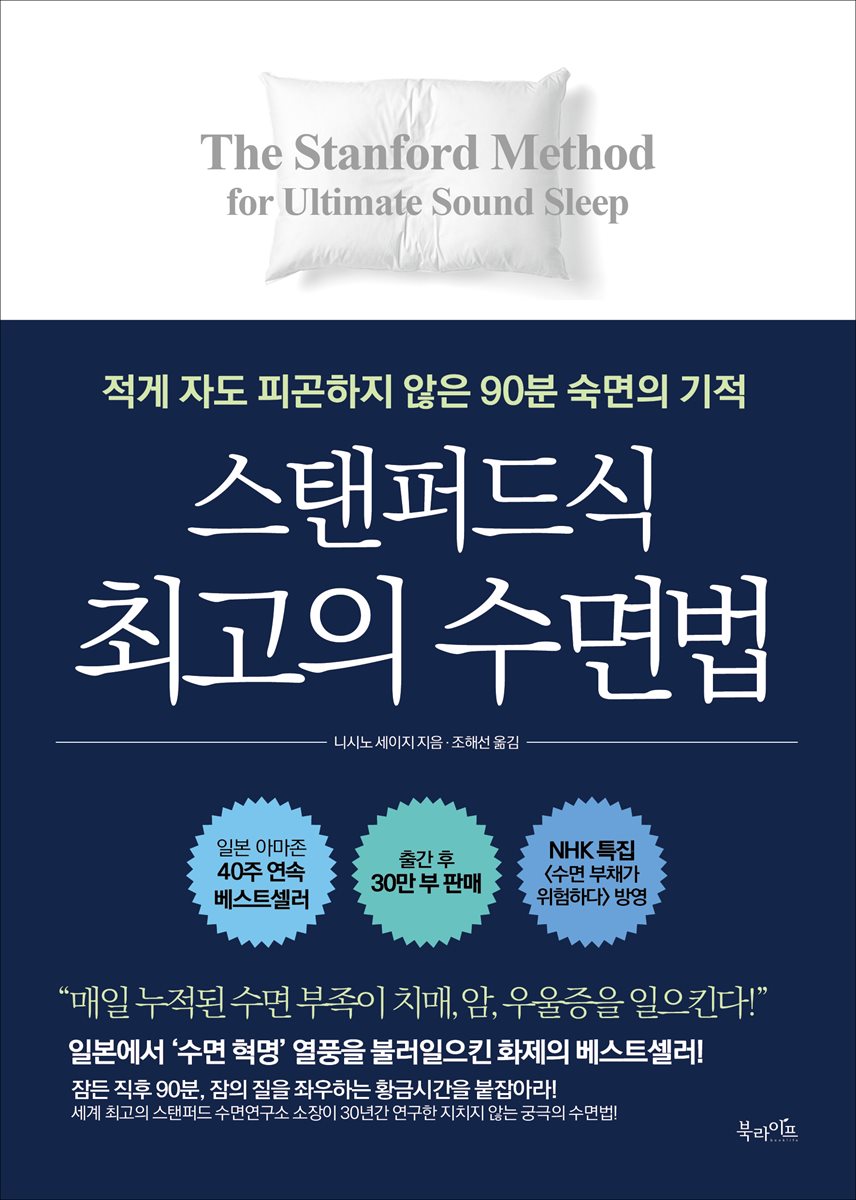
☆읽은 부분☆
제 4장.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체온과 뇌가 최고의 수면을 선사한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실제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나마 차이가 날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면잠복기(sleep latency)라고 부른다. 침구 제조 업체인 에어위브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모집해 수면잠복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평균 7~8분 만에 잠들었다. 이 정도가 정상 수치다. 비교를 위해 건강하지만 '잠드는 데 오래 걸린다'고 자각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수면잠복기를 측정하니 약 10분이 나왔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에 불과한 것이다.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중 몇 십 분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가 아닌 이상 '요즘 잠을 통 못 이루는 것 같다'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다도 괜찮다.
한마디로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심하게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실수가 잦다' 등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 이용이나 스트레스를 비롯해 다양한 자극이 넘쳐나는 '잠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간다. 부끄럽지만 나도 자기 직전까지 일하거나 자기 전에 메일을 확인하는 바람에 아침까지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다.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일본인은 수면 편차가 낮다. 그러므로 입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체온과 뇌라는 수면 스위치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수면잠복기)을 우리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잡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는 머리만 대만 금방 잠듭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때 '금방 잠드는 것' 만을 수면의 질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사람들은 누우면 10분안에 잠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면의 질을 판단하려면, 낮 동안에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초롱초롱하게 생활이 가능한가?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도 떠오르고요.
늦게까지 친구와 인터넷채팅 또는 게임, 핸드폰 문자만 해도 늦게 잠들곤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전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컴퓨터게임, TV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까지 보는 시대이니 자기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ㅠㅠ
지금은 한발 떨어져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현재의 청소년이라면 늦게까지 놀고 싶고, 또래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고, 유튜브 영상,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두었거나, 교육자이거나, 청소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읽고 발췌하고 제 생각을 쓴 글입니다.
digitalmom-silverbell.tistory.com/106
[인증 15일차] 지금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시기를 통과한 모든 이들이 글을 읽어봐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할까> 5장에서 가져왔습니다. (131~143쪽) 수면과 청소년기 십대 청소년에게서 깊은 비렘수면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은 건강한 발달이 무엇인지를
digitalmom-silverbell.tistory.com
학생들이 밤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못한채,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영상을 들여다 봅니다. 저는 어른들이 현실을 좀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활용하고 위험성을 알고 아이들과 디지털 세상에 대해 함께 배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이야기에서 청소년과 어른의 디지털교육 이야기로 나아갔네요.
요즘엔 숙면을 하려면 적절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하기에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집에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메세지를 보내느라 아이들에게 집중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내년에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저의 안좋은 습관을 보여주어서 미안하고 부끄럽네요. 스마트폰을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어야 겠습니다.
주말에도 수면기록 꾸준히 해주시고,
함께 <숙면의 모든 것>을 읽으며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어보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꿀잠 자기 프로젝트(나만의 잠 시간 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꿀잠 프로젝트]인증51일차. 사람은 왜 졸릴까?(아데노신과 카페인) (0) | 2020.10.25 |
|---|---|
| [꿀잠 프로젝트]인증50일차. 잠자리 의식(패턴)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자. (0) | 2020.10.24 |
| [꿀잠 프로젝트]인증48일차. 수면 스위치는 '체온'과 '뇌'에 있다. (0) | 2020.10.24 |
| [꿀잠 프로젝트]인증47일차.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0) | 2020.10.17 |
| [꿀잠 프로젝트]인증46일차. 수면주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0) | 2020.10.17 |




